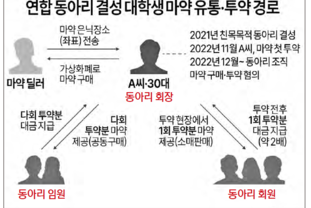아이들이 많아서일까.
오후 2시 37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 733편은 유난히 시끌벅적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공의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목포공항.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거리였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1993년 7월 26일, 김포발 목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국에 타전된다.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전남 해남군 마천마을은 담배 농사를 주로 짓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천둥이 치고 장맛비가 쏟아지던 오후, 빗줄기가 잦아들자 하나둘 밭으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뒤 운거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짙은 안개 속에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웬 피투성이 남자가 걸어와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실종됐던 733편 탑승객으로 항공기 추락이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목포공항 활주로는 733편이 추락한 운거산 너머에 있었다.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비행기는 1, 2차 착륙 시도에 실패하고 3차 시도 중 산을 넘은 것으로 착각하고 고도를 낮췄다가 짙은 구름에 가려졌던 운거산과 마주하게 된다.
기장이 급히 엔진 출력을 높였지만 산 정상을 넘기엔 늦었다. 동체는 세 동강이 나 운거산 6부 능선에 흩어졌다.
“라이터 켜지 마!”
비행기 추락 소식을 들은 마천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운거산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차량 접근이 불가하고 수풀이 우거진 현장에 이들은 낫으로 길을 만들며 전진했다. 그때 누군가 기름 냄새를 맡았고, 불씨라도 튀면 2차 폭발이 날 수 있다는 외침이 퍼졌다.
현장에 오르니 기적처럼 생존자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선 아이들부터 구했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부녀자들의 등에 업혔고, 남자들은 나뭇가지와 겉옷으로 들것을 만들어 구조자를 실어 날랐다.
총 110명의 탑승자 중 48명이 생존했다. 이 가운데 44명을 마천마을 사람들이 직접 구조했다. 살아남은 이들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손에 의해 구해진 것이다.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 단위의 승객들이었고, 아이들이 많았다.
생존자 명단이 공개되자 승객 가족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A 씨는 막내딸의 영정사진을 준비한 채 병원을 전전했다. 어디에도 딸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중환자실, 붕대로 감싸진 채 누워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하지만 병상 이름표도 다르고, 옆엔 아빠라는 남자 B 씨가 있었다.
허탈한 마음에 돌아서던 A 씨는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이의 얼굴을 보여달라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붕대를 푼 아이는 분명 그의 딸이었다.
A 씨가 나타나고 나서야 B 씨도 자신의 진짜 딸을 확인했다. 그의 딸은 다른 병원에 안치된 신원 미확인 사망자였다. 하루아침에 아이의 생사가 바뀐 두 아버지는 서로 손을 붙잡고 말없이 울었다.

이 비극을 만든 원인은 악천후와 조종사의 착오만이 아니었다.
해군 공항으로 쓰이던 목포공항은 민항기 운항을 시작한 지 1년에 불과했고, 활주로는 짧고 폭도 좁았다. 착륙 유도장치(ILS)도 설치되지 않았다. 무리한 착륙 시도 뒤에는, 당시 정시운항률 경쟁에 내몰린 항공 업계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고 후 목포공항은 폐쇄됐다. 이후에 정부는 항공 안전 체계를 보완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개항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도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다. 철새 도래지에 지어진 공항 위치와 콘크리트 둔덕으로 쌓은 로컬라이저가 희생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년 전 목포공항의 비극은 공항의 구조적 한계와 당시 항공업계의 무리한 경쟁이 함께 빚어낸 총체적 인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같은 비극 앞에서 후회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