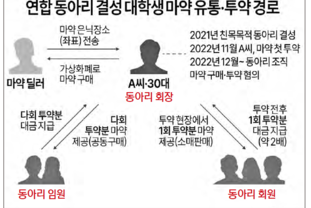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앙코르 유적 덕분에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산업이 캄보디아에서 성행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엔이 동남아시아를 사기 작업장의 ‘그라운드 제로(시초)’로 부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전역에서 총 53곳의 ‘사기 작업장’을 확인했고, 45곳의 의심 시설을 발견했다는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곳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의 온라인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국제적 규모로 성장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 범죄 조직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조직의 형태도 기업에 가까웠다.
콜센터,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 리딩, 보이스피싱 등 분야별로 팀을 꾸려 움직였고, 자금 담당과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는 이체 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팀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들은 팬데믹 때 버려진 카지노와 호텔 시설을 사들여 사기 작업장으로 개조한 뒤 ‘취업’을 미끼로 각국의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숙식을 제공하는 고액의 일자리를 미끼로 젊은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속아 캄보디아로 온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했다. 작업장은 고압 전기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 경비원이 상주하는 곳이다.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방 등의 온라인 사기를 벌이도록 강요받았다. 일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에겐 구타와 고문 등의 가혹 행위가 가해졌다.
지난달 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각종 사기를 벌여 온 기업형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계 총책에 의해 움직인 조직에서 한국인 가담자는 총 48명이었고, 이 중 18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관계자로 가장한 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총 5억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에는 한국인을 총책으로 한 범죄 조직도 발각됐다. 당시 한국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 협조해 120억원 규모의 피싱 범죄를 저지른 강 모 씨 부부를 현지에서 체포했다.
강 씨 부부는 이른바 ‘웬치(감옥)’라 불리는 거대 범죄 단지 안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취업 사기로 유인한 20~30대의 한국인 남녀를 감금한 채 범행에 이용했다. 그런데 현지에서 한국 송환을 기다리던 강 씨 부부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돌연 석방되었고 국내 송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캄보디아와 한국은 2009년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발효시켰으나 인터폴 적색 수배자들이 풀려나면서 양국 간 국제 공조 체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찰은 강 씨 부부와 현지 고위 관료와의 뇌물 거래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8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58위에 오를 정도로 공권력의 청렴도가 낮고 뇌물이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는 사회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범죄 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몰려들고 있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캄보디아 사기 산업의 규모가 연 125억달러(약 17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캄보디아가 범죄 조직의 국제적 거점이 되면서 현지에 있는 교민들은 한국 정부에 ‘캄보디아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 저변에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국제 공조 체계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현지 교민들은 범죄에 노출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교민 보호와 국제 범죄 확산의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