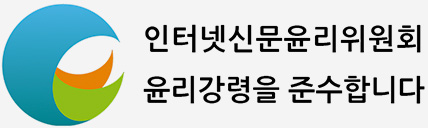2002년 봄, 수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운동장을 지나갈 때였다. 어느덧 피어난 민들레, 개나리 등을 보며 봄기운에 시선을 두고 사동 쪽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계장님! 계장님!”
계속해서 부르기에 고개를 돌려보니 몽골 수용자 바타르였다.
“나 내일 집에 가요. 계장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며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모양을 했다. 나는 바타르에게 “그래? 나가서 잘 살아.”라고 대답해 주고 거실로 들어가는 수용자들 쪽으로 향하는데 마음 한곳이 찡했다.
몽골 수용자 바타르는 작년 초 내가 작업 팀장으로 근무할 때 소속 작업장 수용자였다. 운동하다 발을 다쳐 의료과 진료 후 처방 약을 받아 왔는데 다음 날 작업장에 출역하고 보니 다친 발에 부기가 빠지지 않아 보여 내가 의료과에 전화를 넣었다. 아무래도 뼈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X-RAY를 찍게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바타르는 병사에 두 달여 간 입병해서 치료받고 작업장에 다시 나왔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내가 다른 수용자들이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내 사무실(작업팀 사무실)에 와 탁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게 해주는 등 완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었더니 그게 고마웠던 모양이다. 작업팀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마주칠 때마다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곤 했다.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시간 중 수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있다. 퇴임하는 선배들에게 지금까지 몇 명의 수용자를 교정 교화시켰느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것도 비뚤어진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퇴임하는 선배 중 후배들 가슴에 새겨지는 말을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 “라떼는 말이야”가 될 것 같다. 퇴임하는 선배들의 퇴임사 중 가장 많은 내용은 공직 생활하는 동안 큰 잘못 없이 퇴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몇 년 전 퇴임식에서 어떤 선배가 자신이 교도관 생활하면서 가장 아픈 기억을 말했다. 사동 담당할 때 A란 수용자가 있었는데 성질이 어찌나 급하고 꼴통짓을 하며 괴롭히는지 힘들었다고 한다. 하루는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A가 자기 말 좀 들어달라 하더니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내일 하자' 타이르고 퇴근했는데 다음 날 출근해 보니 그가 진짜로 죽어있었더라며, 퇴근을 좀 늦게 하더라도 A의 말을 들어줄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수용자가 심각하게 얘기하면 한 번쯤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조언을 남기고 후배들 곁을 떠났다. 나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고 나올까?
한 중국인 출소자의 편지를 전해주고 싶다.
“몇 번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늘 신경 써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보호소에 잘 왔습니다. 9년여의 수용 생활 속에서 매번 뵐 때마다 따듯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계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길다고 합니다. 언젠가 만나 뵙게 되면 감사한 마음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허물어진 인생이 되었지만….”
후배들에게 이 말과 함께 내 가슴 속에 품었던 기도를 하나 들려주고 싶다.
“주여! 이것이 임께 드리는 제 기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쁨과 슬픔을 조용히 참고 견딜 힘을 주십시오. 이 가슴 속 가난의 뿌리를 치고 또 치십시오. 제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이를 업신여기다가 오만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날의 하찮은 일들을 높이 초연케 할 힘을 주십시오. 제 삶을 임의 뜻에 맡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