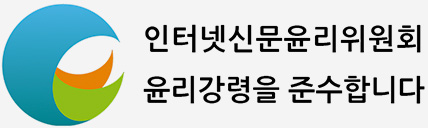최근 3년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된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주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많아,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원의 배상명령 인용률은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49.8%에서 3년 만에 14.3% 하락한 수치다.
특히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중 청구한 배상명령 신청 10건 중 7건이 각하되는 상황이다. 배상명령 제도는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로, 1981년 도입된 이후 범죄 피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피해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상당수 신청이 각하되고 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 불명, 공판 지연 가능성 등도 기각 사유에 포함되며, 실질적인 구제 효과는 점점 미미해지는 실정이다.
사기범죄의 지능화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나 수법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은 쉽지 않다.
법원은 피해금액이 일부라도 변제된 경우에는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5000만원 피해에 대해 피고인이 100만원만 갚았더라도, 법원이 ‘일부 배상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배상 청구는 각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놓여 있다.
심지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현실적인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피해액 특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실체를 심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죄 판결 이후조차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배상액을 산정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없이는 신청조차 쉽지 않다”면서 “사기 피해자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를 일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