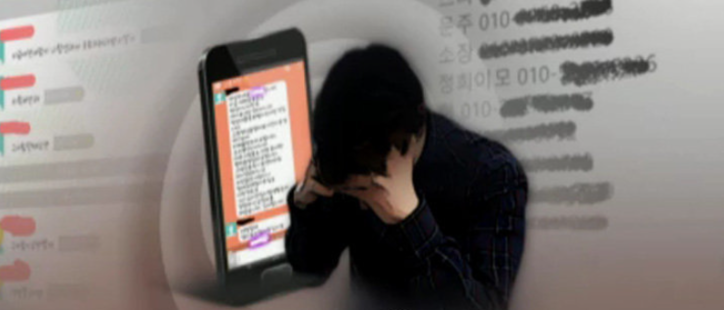
“검찰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표적인 문구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송금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떠안는 사례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사기로 출발한 보이스피싱은 이제 심리 조작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첨단 구조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및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 대만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됐다. 국내에는 2006년 처음 등장했으며, 같은 해 5월 18일 ‘국세청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는 “환급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 정보를 넘겨 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을 유도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스푸핑(spoofing)’, 인터넷전화 중계기, 가짜 웹사이트 유도 등이 결합된 기술 기반 수법이 본격화됐다. 이 시기부터는 신분증 위조와 대포통장 매매도 조직적으로 활용됐다.
2014년 이후에는 ‘수거책’과 ‘인출책’을 활용한 대면 편취형 범행이 확산됐다.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콜센터, 총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업화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신속지급정지제’, 대포통장 중개·알선 시 7년간 금융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며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같은 해 6월 대구지검은 약 300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했다. 당시 총책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전까지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됐으며, 형량은 대부분 10년 미만에 그쳤다. 해당 판결은 보이스피싱을 중대 조직 범죄로 인식하게 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19년 이후에는 조직이 국제화되며 총책은 해외에 거주하고, 콜센터는 중국·필리핀 등에 설치됐다. 국내에서는 브로커가 계좌 모집과 수거책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이 시기부터 가상자산(코인)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계좌-코인-현금’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자금 흐름이 일반화됐다.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결합되기 시작했다. AI 기반 딥보이스 기술로 지인의 음성을 모방하거나, 실시간 영상 통화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도 병행되며,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1년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 내역 제출과 자금 추적 의무를 부과했고, 2023년에는 ‘AI 기반 피싱 방지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보이스피싱과 유사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 피해 사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에 약 60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TF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투자 리딩방, 문자 기반 스미싱, 연애 빙자형 사기 등 10대 악성 사기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입법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한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경찰청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해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통합 관리하고, 피해 의심 계좌를 신속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 중심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정 요건 충족 시 사기범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담겨 있어 주목된다.
이는 기존 신상공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되며, 유죄 확정자의 경우에도 성범죄자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대 사기범조차 신원을 가린 채 재판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신상공개 확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발의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50억원 이상 사기·횡령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이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2년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역시 같은 취지로, 2023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췄다.
현재 해당 법안은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공동체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사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검거 보상금 제도’도 시행됐다. 기존 상한인 1억원에서 5배 상향된 조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조치권 도입 등 선제적 대응 없이는 피해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