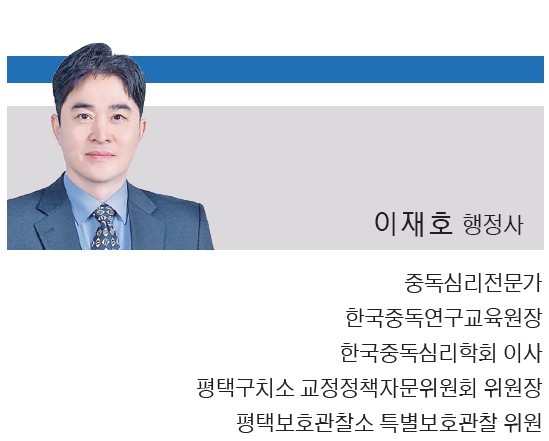
부산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1295회나 몰래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단순히 성적 충동이 강하거나 일시적 일탈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뇌의 학습된 함정이 숨어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쾌락을 느끼는 물질’이 아니라 ‘보상을 예측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보다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탐색과 추구의 감정, 즉 ‘기대의 긴장감’을 강화시킨다.
이 남성의 경우도 성적 욕망 그 자체보다 “이번에도 들키지 않고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는 촬영의 성공이 곧 ‘보상’으로 연결되었고, 뇌는 그 경험을 기억해 반복 행동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그는 성적 해소가 아닌 ‘은밀하게 성공했다’는 심리적 쾌감에 중독된 것이다.
도파민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금기와 위험’이 결합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이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공할 때의 쾌감’은 단순한 쾌락보다 훨씬 강력한 신경학적 보상을 준다. 이 남성은 몰래카메라를 들고 지하철을 돌며 ‘금지된 행동’을 ‘성공’시킬 때마다 뇌의 도파민 보상회로가 폭발적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그때 느낀 긴장과 해방감, 성공의 순간이 곧 ‘보상 예측 오류’로 작용하며, 뇌는 “이 행동은 해야만 한다”는 신호를 강화한다.
결국 그는 성적 자극이 아니라 ‘성공적 몰래 촬영’이라는 보상 구조에 중독된 상태가 된다. 이런 현상은 마약, 도박, 게임, 스마트폰 중독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따른다. 즉 ‘성적 일탈’이 아니라 도파민 시스템의 학습적 오류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를 단순히 ‘성욕 억제’나 ‘충동조절 실패’로만 다루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성욕억제제나 단기 처벌은 일시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보상 시스템의 왜곡을 교정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치료의 핵심은 ‘억제’가 아니라 ‘재학습’이다.
도파민 보상체계가 왜곡된 상태에서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은밀함=보상’이라는 잘못된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수정해야 한다. 또한 노출 및 반응 방지, 도파민 절제 훈련, 정서 조절 훈련 등을 병행함으로써 ‘긴장-해방’의 보상 패턴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충동을 억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뇌에 새 학습을 심어주는 인지적 재훈련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성범죄를 단순히 도덕적 타락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교정기관과 법원, 상담기관은 도파민 중독의 신경학적 실체를 이해하고 치료 프로토콜에 반영해야 한다. 도파민 강화 구조를 차단하지 않는 한, 같은 범행은 형태만 바뀐 채 반복된다.
교정 현장에서는 ‘성충동 억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상 체계의 재구조화와 인지적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파민 중독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된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욕망이 아니다. 그 욕망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뇌의 보상 시스템, 바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성범죄의 실체를 신경과학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재범을 막고 진정한 교정과 회복을 실현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