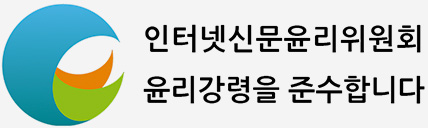재판이나 촬영 등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나의 월요일 오전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다. 바로 구치소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월요일 아침의 일상은 활기차지만, 나의 목적지는 세상의 활기가 무색할 만큼 정적이며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곳이다.
월요일을 구치소 접견으로 시작하는 이 루틴은, 내가 어쏘(Associate) 변호사였던 시절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성실한 파트너 변호사님의 루틴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변호사 생활 11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나는 이 월요일의 루틴을 고집스럽게 지켜오고 있다. 물론 갑작스러운 재판 일정으로 요일을 변경할 때도 있지만, 월요일 아침에 피고인을 마주하지 않으면 한 주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듯한 기분이 든다.
매주 월요일마다 구치소에서 피고인들과 마주 앉는다. 접견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면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사건의 쟁점과 본질을 파악하고, 수사 기록 뒤에 숨겨진 피고인의 내밀한 사정을 듣는 시간이다. 나는 이 대화의 편린들을 한데 모아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할 언어를 고른다.
나는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과잉 기소에는 ‘법리에 맞는 합당한 형량’을 요구하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의 증거를 찾아내며, 피고인에게 단 한 점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매주 구치소로 향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흔히 ‘사건의 정답은 기록에 있다’는 말이 격언처럼 내려온다. 하지만 현장에서 치열하게 발로 뛰며 느낀 점은, 그 말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것이다. 기록은 결국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기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관점에서 구성한 텍스트다. 실체적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오직 피고인 본인뿐이다.
그렇기에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기록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변호인 접견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절차다.
간혹 주변에서 의아한 눈빛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왜 그렇게 변호인 접견을 자주 가나요?”, “변호사님 시간도 귀한데, 매주 가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라는 취지의 질문들이다.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합치면 반나절이 꼬박 소요되는 구치소행이 다른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있다. 피고인과의 잦은 소통은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라는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피고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그들의 표정 변화를 살피며, 기록에는 채 담기지 못한 사건 당일의 공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최근 ‘선임한 변호사’와 실제로 구치소에 ‘접견 오는 변호사’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이른바 ‘대리 접견’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개탄이다. 물론 로펌의 규모나 부득이한 여건상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고인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면, 사건의 책임 변호사가 직접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보다 올바른 접근법이 있을까 싶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영혼을 대리하는 자다. 그 영혼과의 소통을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진실의 힘은 희석되기 마련이다.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 뒤편에서 묵직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언제나 마음을 다잡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매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월요일이겠지만, 구치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매주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30분 접견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자 희망일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기대를 등에 업고 일터로 향한다. 법전의 글자보다 뜨거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11년 전 파트너 변호사님의 뒷모습에서 배운 이 루틴은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도 내가 법조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