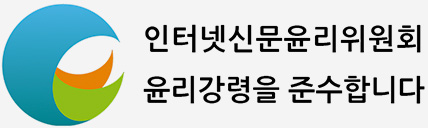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주소지 송달이나 전화 연락 등 개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책으로 활동하며 발신번호를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고 검사 사칭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1152만 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1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으나 정지기간 종료 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잠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 확인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뒤 올해 1월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후 2·3차 공판도 모두 불출석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5월 4차 기일에 궐석재판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문제는 공시송달 이전의 조치였다. 사건 기록에는 A씨의 다른 주거지 주소, 본인 및 가족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해당 주소지로의 송달 시도는 물론 전화 연락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기록상 피고인의 기존 주소 외에 다른 주소와 본인·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송달이나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결국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이른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63조는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만 공시송달을 허용한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소재 파악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한 뒤에도 실패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공시송달은 예외적 제도인데 기록에 소재 확인 단서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도주나 불출석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