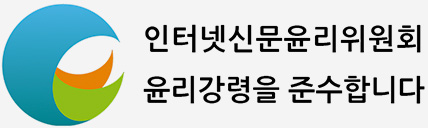사무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사건기록이다. 책상 위에 정리된 파일을 펼치면, 늘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사실관계’, 변호사의 하루는 이 단어에서 시작해 이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서면은 언제나 사실관계 위에 세워지고,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모든 논리도 함께 흔들린다.
나는 변호사다. 그리고 습관처럼 모든 문장을 근거 위에 세우려 한다. 의뢰인은 종종 결론을 먼저 묻는다. “이길 수 있나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는다. 먼저 기록을 펼치고, 조문을 확인하고, 판례를 살핀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논리의 뼈대가 서면 안에서 먼저 서지 않으면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는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서면은 결국 말의 예행연습이자, 판결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설득이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서면은 종류가 달라도 기본 구조는 같다. 소장이든 준비서면이든, 변호인 의견서나 항소이유서든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인가. 무엇이 다툼 없는 사실이고, 무엇이 입증해야 할 사실인가. 무엇이 핵심 쟁점이고, 무엇이 주변 소음인가. 이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문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법원은 감탄할 문장이 아니라 판단할 재료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문서의 맨 위에 늘 네 가지를 적어둔다. 제목, 사실관계, 법리, 결론. 이 네 가지가 서면의 좌표다. 제목은 방향을 정하고, 사실관계는 길을 깔며, 법리는 다리를 놓고, 결론은 도착지를 만든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서면은 길을 잃는다.
특히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를 앞세운 서면은 설득 이전에 혼란을 남기기 쉽다. 자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녹취록과 메시지 기록이다. 다만 기록 역시 그대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날짜가 바뀌어 찍힌 화면, 맥락이 잘린 문장, 대화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 일부 캡처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원본으로 주세요”라고 말한다. 서면은 사실을 조각내어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의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의뢰인과의 면담에서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시간순으로 정렬한다.
억울함이나 분노, 두려움은 분명 중요하지만, 법정의 언어는 다르다. 법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으며, 그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야 한다. 변호사의 역할은 감정의 언어를 사실의 언어로 옮기되 그 감정을 지워버리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혼자 조사를 받은 뒤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초기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사건의 방향을 빠르게 굳혀버린다. 나중에 아무리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해도, 이미 남겨진 문장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서면의 출발점은 언제나 ‘초기 대응’이다. 서면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윤곽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항소이유서를 쓸 때는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들고 있으면, 마음 한쪽에서는 결과를 뒤집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원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보려는 판단이 고개를 든다.
그 사이에서 기록을 다시 펼치고, 문장을 다시 고친다. 감정이 앞서면 논리가 흐려지고, 논리가 흐려지면 설득은 멀어진다. 한 줄의 문장이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면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사무실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목차부터 잡으시죠.” 맞는 말이다.
나는 어떤 사건이든 목차부터 잡는다. 목차는 생각의 지도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사실을 덜어내고, 쟁점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서면의 역할이다. 변호사가 쓰는 문서는 결국 사람의 삶을 다룬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실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결론을 쓰는 일을 반복한다. 근거 위에 문장을 세우되 그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서면은 차갑지만, 그 서면이 닿는 곳은 언제나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그 점이 이 일을 어렵게도, 계속하게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