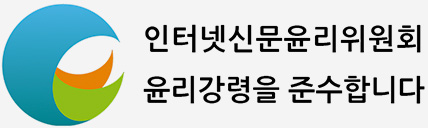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strong>이혼 CG [연합뉴스 자료]</strong>](http://www.tsisalaw.com/data/photos/20260105/art_17696518778743_9f1d25.png?iqs=0.2156411531396295)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친족 명의로 옮겼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까.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며 한 여성이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왔다. A씨는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아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예금까지 마련해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 명의로 이전됐고 차량은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으며 예금 대부분도 누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닌데 나눌 게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실무와 판례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이미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중 기여도 ▲재산 이전 시점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계속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명의 이전이나 담보 설정을 제한할 수 있고, 예금이나 매각대금 등 금전 채권은 가압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이미 재산이 친족 명의로 이전됐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문제된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이 준용되며, 제소 기간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다.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친족에게 예금이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증여 또는 가장변제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배우자의 외도가 입증될 경우,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배희정 변호사는 “이혼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부동산·예금·차량을 친족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재산분할 회피 시도”라며 “법원은 명의 이전 자체보다 그 실질과 목적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면 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추가 유출을 막고, 이미 이전된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되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