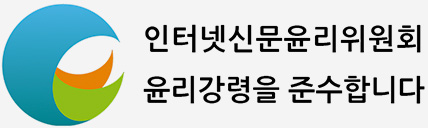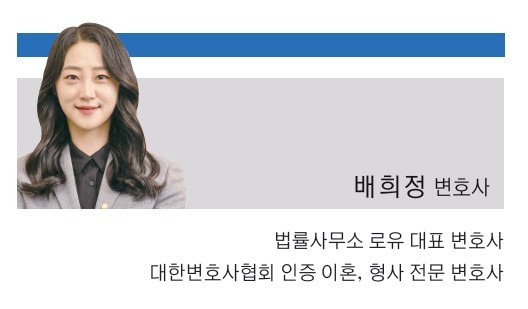
보통은 음악 없이 업무를 보는 것이 익숙하다. 조용한 환경에서 머릿속이 정리되는 편이고, 서면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검토할 때는 오롯이 글과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다 간혹 정말 바쁘거나 집중이 필요한 날이면 클래식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메탈을 들으며 운전하면 차가 질주하듯 빨리 가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건넸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나와는 거리가 먼 장르라 생각했던 메탈 음악이 어느새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최근 마음에 들어 자주 듣고 있는 음악은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으로, 1991년에 발매된 유명한 곡이다. 초반에 등장하는 기타 리프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려 듣게 됐다.
막상 들으니 왜 이 곡이 시대를 넘어 회자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도, 어떤 흐름을 예고하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의외였던 점은 이 음악이 내 업무 리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메탈을 들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보통 기일에 참석할 때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아무 음악도 듣지 않고 가는 편이었는데, ‘싸우러 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했던 날 메탈 음악을 틀어봤다.
신기하게도 곡이 진행될수록 정리해 둔 쟁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고, 법정에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아드레날린이 도는 건지, 음악이 몰입을 돕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후로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들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취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때그때 사건의 성격이나 나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히려 그런 예측 불가능함이 더 좋다.
다양한 장르를 듣는 것처럼, 다양한 사건을 접하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성범죄, 특수강도, 범죄단체, 도박개장…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분야만 파고드는 것도 괜찮지만 폭넓은 사건을 다루었을 때의 이점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 다양성이 때로는 사건의 실마리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배운 논점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성범죄에서 파악했던 증거 구조가 엉뚱하게도 도박개장 사건에서 떠오르기도 한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결국 형사사건의 핵심은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해해야 설득할 수 있고, 설득해야 변호가 된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사건을 맡았을 때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할지 금세 감이 온다. 경험이 쌓인다는 게 이런 건가 싶다. 사건마다 다른 리듬이 있지만, 그 리듬을 금방 찾아내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면 설명이 쉬울 것 같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모두 다른 사람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해결책을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스스로 경계심을 갖는다. 익숙함은 때로 위험하다. 사건의 흐름이 읽힌다고 해서 결말까지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새로운 사건은 언제나 새로운 악보다. 첫 소절이 비슷해도 결국 다른 음악이다. 그래서 나는 매 사건을 ‘처음 듣는 곡’이라고 생각한다.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부분에서 전환이 생길지, 마지막은 어떤 결말로 끝날지를 예단하지 않는 것. 그 겸손함이 사건을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믿는다.
익숙함에 기대지 말고, 흐름이 읽힌다고 해서 결말까지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되뇌다보면 사건은 한 사람의 삶이 걸린 문제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조건 같은 전략을 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해결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사건마다 다른 박자와 흐름이 있다. 어떤 것은 빠르게 몰아치듯 진행되고, 어떤 것은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관찰해야 한다. 음악을 오래 들으면 첫 소절만 들어도 곡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듯, 형사사건도 기록의 첫 부분만 봐도 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읽힐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