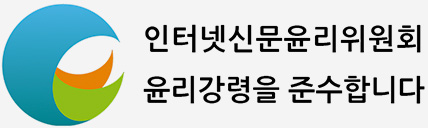30년 전 일이다. 좁은 골목 벽돌담에 켜켜이 쌓인 누런 연탄재와 ‘개 조심’ 문구, 골목 끝 초록색 양철 대문 오른편에 네 식구가 세 들어 사는 문간방이 우리 집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누나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군밤을 까먹고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올까?”
당시 여섯 살인 나는 기대에 부풀어 말했다.
“이제 세상에 산타는 없어.” 누나가 찬물을끼얹듯 말했다.
“혹시 모르니 양말 걸어 두자.”
그렇게 양말 두 짝을 못에 걸고 잠들었다.
다음날 나를 흔들어 깨운 누나가 눈앞에 양말을 들이밀며 간밤에 산타가 다녀갔다고 말했다.
묵직한 양말을 보고 화들짝 잠에서 깬 나는 선물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다. 양말 안에는 빨간 사과 두 개가 들어있었다. 눈사람이 연상되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났다.
누나와 나는 TV 앞에 둘러앉아 사과를 먹었다. 주먹만 한 사과를 한 입 크게 깨물자 아삭 소리와 함께 과즙이 입안에 가득 찼다. 아랫목에선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창문으로 들어온 무지개 빛은 가슴속을 유영했다.
어두운 밤길 산타는 문 닫는 점포에 들러 꼬깃꼬깃 접어둔 비상금으로 선물을 샀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해 할 남매를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지. 산타의 귀갓길을 상상하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쩌면 우리가 바란 선물은 값비싼 무언가가 아닌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