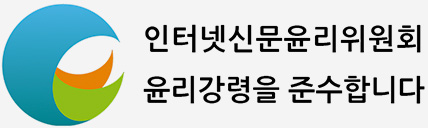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나는 유난히 피렌체를 좋아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미켈란젤로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이 도시는 자유와 창의성의 이미지로 가득한 곳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 같은 영화나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같은 소설에서도 피렌체는 인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하며, 내게 각별한 인상을 남겼다.
대학 1학년 때 처음 떠난 배낭여행에서 피렌체를 찾았을 때, 나는 그 도시가 가진 예술적 생동감에 깊이 매료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거리 곳곳에 자리한 가죽 옷 공방들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피렌체에 가면 가죽 재킷 하나쯤은 꼭 사야 한다고 말해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짜리 대학생에게는 어울리기 어려운 스타일의 옷들이었고, 그 말을 들은 걸 후회도 했지만, 그 덕분에 공방을 구경할 수 있었다.
가게 뒤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방에서는 나이 든 장인과 젊은 견습생들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원단 위에 초크로 선을 긋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재봉틀 앞에서 집중하며 박음질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공방이라는 공간은 그들의 직장이자 삶의 터전이었고, 하나의 철학이자 세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법률사무소도 그런 공방처럼 만들고 싶다. 법률문서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마치 수공예 장인처럼 세심한 손길과 집중이 깃들기를 바란다. 물론 지금 나는 아직 장인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장인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랬듯, 창의성과 치열함을 담아 한 문장, 한 문장을 직접 써 내려간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런 서면은 따라 하기 어렵다. 기성복이 수제 맞춤복의 정교함과 감각을 따라갈 수 없듯이, ‘좋은 서면’도 그 사람의 철학과 손끝의 온기를 담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파트너 변호사와는 초안 작성 전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 후에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끊임없이 다듬는다.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할 때도 단순히 질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판사라면 이 문장이 설득력 있겠는가?”, “당신이 증인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는가?”를 묻고 또 묻는다. 그렇게 함께 고르고 다듬는 작업이 즐겁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도, 결국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든다. 이 일은 글을 쓰는 노동이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과 이성을 움직이는 작업이다.
말보다 글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현실 때문이다. 수사도 재판도 서면 중심이다. 판사는 일주일에 수십 건의 사건을 재판하고, 사건 하나를 반년에서 1년 넘게 다루다가 인사이동으로 바뀌기도 한다. 당연히 어느 한 기일에 변호인이 잘 말했다고 해서 그 인상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는다. 결국 판결을 쓰는 순간에 판사의 기억을 움직이는 것은 기록 속 ‘글’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글에 진심을 담는다. 판사나 검사, 수사관은 최소한 ‘변호인의 문제제기가 타당한가’를 확인하려 서면을 꼼꼼히 본다. 그 글이 논리적이고 신뢰를 준다면, 비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다.
바닷물의 표층, 중간층, 심해층이 온도나 색깔, 흐름이 제각기 다르듯이, 좋은 서면은 각각의 층위에서 논리, 감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정치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밖에도 일반 상식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정당하고 우리가 지면 한쪽이 너무 억울해진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한 번씩만 언급한다고 충분해지는 것이 아니다. 얇은 층을 겹겹이 반복해서 입힌 페이스트리 빵처럼, 주제곡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교향곡처럼, 같은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요한 건, 그 글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사가 반드시 알아챈다는 점이다. 긴 글을 써본 사람은 안다. 억지로 포장된 문장은 결국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틈이 생기고, 거짓은 금방 들통 난다. 진실은 어떤 말보다 강하다.
마지막으로, 장인정신에는 ‘시간’을 미리 확보해두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다. 내가 판사로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중요한 변론요지서가 선고 전날에 도착했을 때다. 그 글이 아무리 정성스럽더라도, 이미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좋은 글은 타이밍도 중요하다. 제때에 제출되어야 읽는 사람의 판단을 움직일 수 있다.
법률 장인의 공방은 그런 곳이다. 글로 말하고, 말로 행동하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공간. 그런 사무실을 나는 매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