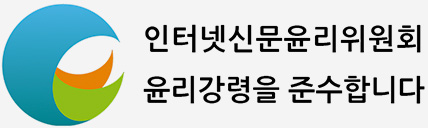엄마가 지병인 당뇨병과 백내장에 더해 불면증, 불안장애를 얻었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돼 한 달에 한 번 고향 집에 내려가 엄마를 돌봐 왔었다.
고향 집에 갈 때는 편하게 입을 티셔츠와 바지, 속옷과 양말, 스킨, 로션을 배낭에 담아 간다. 여름옷은 괜찮지만 가을옷과 겨울옷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힘들다. 아예 짐을 놓고 다닐까 싶어 엄마에게 “작은 서랍장 하나 살까?”라고 물었지만 사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거 몇 개나 된다고 그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아니면 네 아버지가 쓰던 거 써도 되고”
“힘들단 말이야” 아차! 일흔을 코앞에 둔 엄마 앞에서 힘들다는 푸념은 백전백패이건만. 엄마는 새치가 하나둘 나기 시작하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작은 방 장롱 맨 아래 칸 비워 둘 테니까 거기다 넣어” 내 물건을 넣어 둘 공간이 생기면서 나는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뒤엔 기모 바지와 수면 잠옷, 수면 양말, 패딩 조끼까지 챙겼다. 장롱은 내 물건으로 금세 가득 찼다.
“한 칸만 더 줘. 이걸로는 모자라” 나는 엄마의 장롱 한 칸을 더 분양받으려고 졸랐다. 30대 중반이 되었어도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응석받이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을 일보다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할 일이 더 많아졌음에도 말이다.
“텔레비전 소리가 안 난다. 여태 잘 나왔는데 네가 뭐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충전을 깜빡했더니 휴대전화가 이제 안 켜지려나 봐. 어떡하지?”, “프라이팬이 다 상했네. 이거 어쩌냐?”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는 자주 전화를 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 보라고 일러줬다. 엄마는 늘 똑같은 말로 통화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언제 온다고?”, 번번이 해결사 노릇을 하지만 가끔은 바로바로 해줄 수 없는 일도 있다.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그 곁을 지켜주는 일이다. 하루는 경로당에 다녀온 엄마가 말했다.
“나이 먹고 계단에서 잘못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대. 어휴, 네가 와야 그나마 산책도 하고 움직여도 보는데… 혼자서는 영 싫네.” 갖가지 이유로 시시콜콜한 통화를 주고받으며 엄마와 함께하려 노력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경로당에 가거나 나와 통화할 때가 아닌 시간에 엄마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 엄마를 떠올리면 코끝이 시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