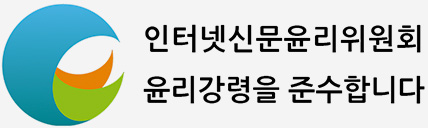2003년 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장동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이 사건은 2017년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준영 변호사가 장씨를 도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2003년 당시 수사의 허점들이 드러났다.
재심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장씨는 곧바로 출소하지 못했다.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넣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장동오씨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 누워 독한 항암치료도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2일, 드디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던 날 그는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왼손과 왼발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였다. 현직 교도관으로 병원에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독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교도소 내 중증 환자는 외부에서만큼의 치료와 관리를 받기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전자발찌와 발목,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있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어려움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도 근무수칙을 지키느라 수갑을 풀어줄 수 없다. 장동오씨의 임종 직전 담당 교도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수갑을 느슨하게 늘려주는 일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겪은 일 중 가장 끔찍하고 안타까웠던 이는 암으로 입원했던 70대 노인 수용자였다. 부인이 병원으로 면회를 왔는데 수용자의 몸을 돌려세워 보니 엉덩이에 욕창이 심해 8cm 이상의 구멍이 생겼던 것이다. 눈으로 차마 못 볼 지경이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형집행정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중병으로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욕창이 심해졌던 것이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부인은 본인이 남편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느냐며 난리를 쳤을 일인데, 차분하고 조용히 의견을 전달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나는 부인에게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안내해 줬다. 현직에 있을 때를 돌이켜보면 많은 수용자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심근경색, 뇌졸중, 말기암, 극단적 선택 등. 교도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일찍 발견해서 살아서 병원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책임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유독 자주 발생하던 때엔 나조차도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흐려지는 듯해 스스로 깜짝 놀란 적도 있다. 수용자들의 삶과 죽음이 내 일상의 매너리즘이 되지 않으려 다짐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공무원답게 근무해라. 지나치게 규정을 따지고 틀에 박힌 형태로 근무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공무원답게 일하라’는 것은 교도관으로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의무지만 법과 규정이 지키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이었다.
법에 눈물이 있다는 말은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보자는 것이었다. 교정조직이 경직되어 있는 만큼 교도관의 재량권도 줄어들고 소극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들의 수갑을 잠시 풀어주는 교도관들도 있다.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라 문책을 당할 수도 있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된 행위라면 교도관들의 행동에 질책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가슴이 따듯한 교도관들의 재량행위는 질책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한다.
오는 21일 장동오씨의 재심 결심공판이 열린다는 소식이다. 비록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이 사건이 사람의 존엄을 교정과 사법의 현장이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