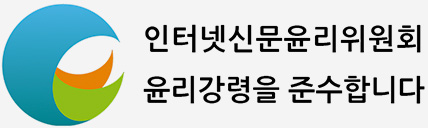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직격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 여야와 대법원·헌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법사위 상정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 “특정인을 위한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의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사법개혁”이라며 맞섰다.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정 사항이라는 헌재 판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에 걸쳐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당초 30명 증원안이 논의됐으나 심사 과정에서 26명으로 조정됐다.
함께 가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이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가 청구 대상이다.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 효력은 정지된다. 헌재가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안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3대 사법개혁법’은 모두 본회의 상정 단계에 이르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등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월말 입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