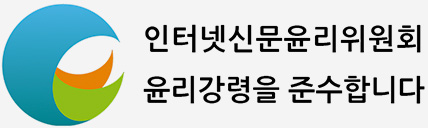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교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내부 증언자를 형사 고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정시설 내 교도관의 폭행과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 재발 방지 및 보호장비 남용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은 50대 수용자 A씨를 CCTV 사각지대 복도에서 폭행해 늑골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진통제 45봉이 발견된 뒤 보호실로 이송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도관들은 A씨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주먹과 발로 옆구리·허벅지·목덜미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13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은 가족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거짓 설명했다. 이후 대전MBC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행정의 조직적 은폐 실태가 드러났다. 또 다른 수용자의 배우자는 “남편도 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이 채워진 채 폭행당했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추가 피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폭행 피해자는 “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맞았다”며 “죄를 지었지만 최소한 사람 대접은 받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교도관의 폭행과 증거인멸 시도는 대전뿐 아니라 목포교도소에서도 반복됐다.
지난 9월 CCTV가 없는 계단실에서 재소자를 폭행하고 1년 넘게 사건을 은폐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5월, 교도관 4명이 수용자 C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진술한 동료 교도관을 오히려 “허위 진술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조사 결과, 교도관 A씨는 ‘수용복 상의 탈의’와 ‘무허가 물품 제작·소지’를 이유로 C씨를 사무실로 호송하던 중 계단실에서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가 없는 계단실에서 폭행하고, 사건 은폐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형생활 중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교도관 폭행·은폐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교정시설의 폐쇄성과 공익신고자 보호 부재를 꼽는다.
법무법인 민(民) 유정화 변호사는 “교정시설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어렵고, 내부 신고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며 “교정본부가 이런 폭력을 ‘개인 일탈’로만 치부한다면 제2·제3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직권조사와 징계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외부 감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