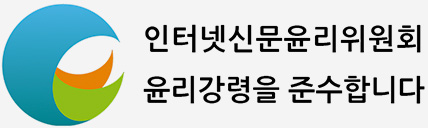최근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서 신고 접수를 놓고 서로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교정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신고 접수와 수사 주체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는 수용자 B씨가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확인되지 않은 도구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가족은 이틀 뒤인 20일 수원 구치소 측에 항의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같은날 피해자 가족 측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사건을 신고했지만 법무부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원구치소는 해당 가족 민원을 접수한 다음 날인 10월 21일에서야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에 공식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정시설 내 범죄에 대해 교정특별사법경찰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일반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대법원은 특정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존재하더라도 일반 경찰의 고유한 수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더시사법률> 질의에 “일반사법경찰관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교정시설 내 범죄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6조의2에 따라 고소장을 수리하고 있으며, 사건이 특사경 직무범위에 해당하면 교정특사경과 협조하거나 사건을 이송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어디든 가능’…수사 안내 기준 마련돼야
법무부는 같은 질의에 대해 “사건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하든 접수는 가능하나, 이후 수사 주체는 검찰·경찰·교정특사경 간의 협의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취지다.
교정시설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정특사경이 우선 수사 주체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정당국 조사에 불신을 갖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우선 사건을 접수한 뒤 검찰·경찰·교정특사경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수사기관이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법무부령 제1000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542호)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정기 점검과 감찰 절차도 따른다. 다만 이러한 지휘 체계가 일반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은 경찰청 설명과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수용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법무부 민원, 교정기관, 관할 경찰서 중 어디에 신고해도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며 “다만 사건을 접수한 뒤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는 검찰·경찰·교정특사경이 협의해 정하는 구조라 사전에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한 기관의 설명만 믿고 신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정당국이든 경찰이든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에게 수사 주체와 절차를 일관되게 안내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