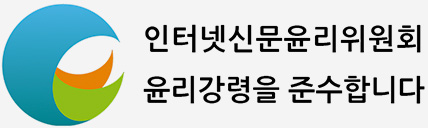어릴 적 나는 자주 아팠다. 한 번은 심한 감기를 앓다 제때 치료를 못 해 중이염으로 번졌다. 그 시절 시골 사람들이 그랬듯 저러다 낫겠거니 하고 내버려 둔 것이 화근이었다.
귓속에 똬리를 튼 농양은 나았다가 덧나기를 반복하며 청력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어머니는 “늦게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하며 평생을 한탄했다.
당시 아버지는 귀를 잘못 건드렸다가 입이 돌아간 동네 사람이 있다며 병원을 못 가게 했다. 대신 두꺼비를 잡아다 말린 후 가루를 내어 수시로 귓속에 흘려넣어 주었다.
아버지만의 확고한 치료법이었다.
어느 여름날, 아버지가 논일을 하다가 막걸리를 걸치러 집에 들렀을 때였다. 내가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아버지가 대뜸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말했다.
훗날 어머니가 말하기로는, 더운 날씨 탓에 내 귀에서 나는 고름 냄새가 심해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단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버스에 올랐다. 어디로 갔는지는 안개처럼 아스라하다. 다만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버스를 타 들떴던 것만 기억에 남는다. 버스에서 내리자 찹쌀떡과 꽈배기를 파는 가게가 보였다.
보리개떡이 최고의 간식인 줄 알았던 내게 그곳은 신세계였다. 큰누나가 찬양하던 그 찹쌀떡이구나! 말랑말랑한 흰 반죽 속에 달콤한 팥소를 숨긴 찹쌀떡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세 개를 사서 내게 쥐여 주며 말했다. “병원까지 더 가야 하니 업혀라.” 그러고는 등을 내밀었다.
씻지도 못하고 윗도리만 갈아입은 아버지의 등에서 진한 땀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찹쌀떡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다. 엄하고 무섭기만 하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아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후로도 아버지 등에 업혀 병원을 오가며 찹쌀떡을 얻어먹었다. 가만히 기대어 아껴 먹던 찹쌀떡이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영원히 아버지 등에 업혀 있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산에서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다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다. 겨우 마흔아홉이었다. 자식에게 난청이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시렸을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리 모질고 엄했을지언정, 마음엔 늘 염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 표현에 인색했기에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모내기가 끝나 가는 철이면 아버지의 먹먹한 눈빛과 아버지의 등을 식탁 삼아 먹던 찹쌀떡이 사무친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그보다 맛있는 찹쌀떡은 먹어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