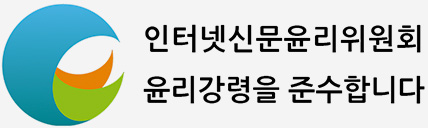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은행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범죄수법이 인공지능(AI)과 가스라이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력을 가진 금융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피해액을 50대 50으로 나눠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싱가포르는 은행이 1순위, 통신사가 2순위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은 “정부도 못하는 일을 은행에 떠넘긴다”며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본래 검찰과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사기관도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를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의심 계좌로 연락을 해도 피해자가 이미 가스라이팅돼 ‘내가 책임질 테니 송금해 달라’고 한다”며 “은행 직원이 몇 시간씩 설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은행권은 특히 피해자의 ‘무과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통신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설정할지, 2금융권에도 같은 책임을 부과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고 우려한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 한도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은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정책 타당성부터 논의해야 하지만 새 정부 기조에 금융권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금융위·금감원·금융사들이 모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