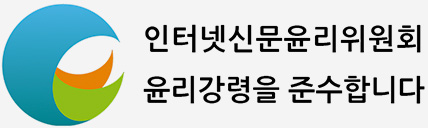가재는 게 편
안녕하세요. 요즘 품 36.5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지난달 재판 출정 중에 겪었던 실제 경험담으로 따뜻함을 한 스푼 더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대전교도소는 출정 인원이 많은 탓에 출정을 오갈 때 직원분들의 관리, 감독이 전에 있었던 천안교도소보다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출정대기실에서 장비를 차고 버스를 타러갈 때,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는 대답을 크게 하고 앞으로 나와 줄을 서야 합니다.
출정 가던 날 전원 장비를 착용한 후 곧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크게 대답 하며 직원의 지시하에 섰는데 제 뒷사람이 이름이 불렸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제 뒤에 서는 겁니다.
직원은 놓치지 않고 제 뒷사람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이 형은(편의상 형이라 칭하겠음) 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이때까지는 별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도착해서 인원 파악을 위해 장비를 풀고 이름을 다시 한 명씩 호명하는데, 이 형은 아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이 불렸을 때 또 대답을 안 하고 손만 들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때 계장님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저기요, 김○○ 씨. 혹시 말을 못 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은 그걸 이제야 알았냐는 듯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세차게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그제야 직원들도 ‘아…’ 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빌런’인 줄 알았던 그 형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나고 교도소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장비를 차고 전원이 1층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인원 파악 겸 이름을 호명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크게 대답 했고, 그 형만 오직 대답 없이 손만 슥 들었습니다.
인원 파악이 끝나고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직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착용이 힘든 사람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에 제 앞에 있던 사람이 잘 안 되는지 낑낑거리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직원을 불렀습니다.
“어윽, 익! 주임님, 여기 벨트 좀 해주세요!”
저는 경악했어요. 예… 맞아요. 말을 못 한다던 그 형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에 저는 한참이나 벙쪄 있었고, 안전벨트 착용을 도와주러 온 주임도 그 형 얼굴을 보더니
“뭐야, 너 아까 말 못 한다던 애 아냐?”라고 물었으나 그 형은 다시 침묵했어요. 주임은 자기 말에 동의를 구하듯이 뒤에 앉은 저를 보며 “아까 그 친구 맞지?”라고 물었고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려는 의도보다는… 왠지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반전 스토리의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소로 복귀하는 내내 ‘저 형은 도대체 왜…?’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벙어리도 입을 열게 만드는 안전벨트의 중요성’ 정도로 이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형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깊은 안도감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