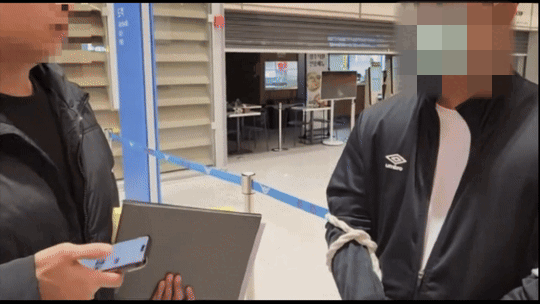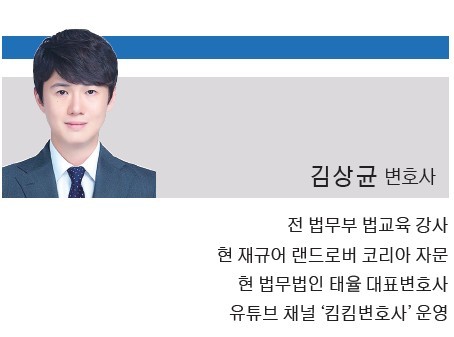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정에 서온 11년, 15000여건의 사건을 마주하며 가장 깊이 새겨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차가운 구치소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의뢰인과 나누었던 절망의 무게, 그리고 마침내 석방이 선고되던 순간 법정을 가득 채우던 안도와 환희의 교차였다. 변호사의 일은 냉랭한 기록과의 씨름이지만, 그 끝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뒤바꾸는 가슴 뜨거운 결과로 귀결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조문은 간결하지만, ‘구속’이라는 두 글자가 한 개인에게 가하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회와의 단절, 직장과 생계의 상실, 가족의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 이 모든 것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한 개인을 덮친다.
변호사에게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은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 선 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을 마주하는 일이며, 그의 무너진 삶을 법리라는 도구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된 과정의 시작이다. 때로는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석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필자가 변호했던 한 공동공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6370 판결)이 떠오른다. 1심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들은 이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가족들은 눈물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다.
항소심의 목표는 명확했다. ‘석방’.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편,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에 전력을 다했다. 밤낮으로 피해자들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했다. 이러한 노력은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의뢰인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변호인석을 바라볼 때, 방청석의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릴 때, 변호사는 지난 모든 과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게 된다. 그 순간의 환희는 어떤 보수와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다.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무너진 가정에 다시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성취감이다. 11년간 15000여건의 형사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석방되지 못한 의뢰인이 단 두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필자가 변호사로서 걸어온 길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원동력이다.
형사 변호는 단순히 유무죄를 다투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이며,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내는 여정이다. 오늘도 차가운 철창 너머에서 희망을 변론하는 모든 동료 변호사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