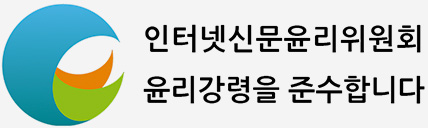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야간 순찰 주기와 동선을 사실상 파악한 뒤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간 시간대 관리 공백이 반복되면서 수용자 간 범죄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교정 관련 갤러리에는 ‘징역 하루 일과 XX 자세하게 시간별로 딱 알려준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전·현직 교정직 준비생과 출소자, 수용 경험자들이 익명으로 교정시설 내부 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있었던 곳이 “경상도 징역”이라며 방 안의 ‘짬(서열) 순서’에 따라 역할이 나뉘는 생활상을 상세히 적었다.
A씨에 따르면 수용동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일정한 분업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침낭 정리와 청소, 물품 정리, 배식 준비, 설거지와 위생 관리 등 대부분의 작업이 서열에 따라 배정되고 점검 전후로는 방 안 규칙에 맞춰 움직임이 통제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점검대형으로 앉아 인원을 확인한 뒤 점검이 끝나면 단체로 인사하며 하루가 시작된다”며 “점검 사이 시간에는 독서나 운동, 장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문제는 야간 시간대다. 그는 “야간이 되면 수용자들끼리 섯다를 치는 등 도박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일과 시간에는 교도관이 불시에 돌아다녀 위험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순찰이 이뤄져 대략 몇 시 몇 분쯤 오는지 다 안다”고 전했다. 이어 “방이 워낙 조용해 교도관 발소리가 들리면 가까워질 때쯤 숨기고 아무 일 없는 척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야간 시간대 교정시설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이 순찰 주기와 접근 시점을 예측한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무면허 시술 강요 사건에서도 유사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수용자 4명은 같은 거실에 수용된 수용자를 협박해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성기 확대 시술’을 강제했으며, 다른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거울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접근 시점을 인지한 상태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구치소 수용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 당시에도 야간 근무에 투입된 교도관은 단 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개 수용동을 교대로 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야간 보안 인력 부족을 꼽는다.
지방의 한 교정시설 보안과장은 <더시사법률>에 “초과근무가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되는 구조로 인해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그 결과 야간 근무 인원이 최소 수준으로 유지돼 응급 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련된 인력이 지방청이나 본부 태스크포스, 사무·심리치료 등 비현장 부서로 이동하면서 행정 조직만 비대해졌다”며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보안 인력 감축 단계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야간 최소 인력 운영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순찰 시간대를 예측하며 행동한다는 증언은 교정시설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형 집행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사소한 계기로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안 인력 확충과 순찰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법무부도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현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