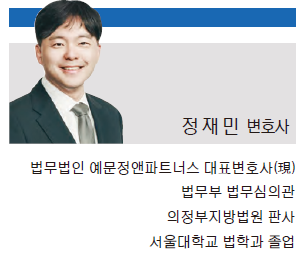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갈 여유가 없어서 직원들과 배달의 민족(‘배민’)으로 유명 유튜버가 추천했다는 비싼 김밥(‘김밥계의 에르메스’라는 별명도 있다)을 3인분 시켰는데 달랑 2인분만 왔다. 직원이 바로 배민에게 얘기하고 1인분 금액 9천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배민은 김밥집 사장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다고 한다.
배민 싸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 김밥집에는 우리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었다. 주문한 양과 배달한 양이 불일치한다, 그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찾아가서 항의하기 전에 빨리 환불을 해달라 등등.
오늘 직원들과 함께 어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직접 한번 그 김밥집에 가보자고 했다. 김밥집은 유리벽 내부가 조금도 보이지 않도록 초록색 썬팅으로 꽁꽁 싸매고 있었다. 왼쪽 구석에 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같이 작은 문이 나 있고 그 앞 테이블 위에 주문을 받아서 만든 김밥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 창구도 내부를 잘 볼 수 없도록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안을 힐끔 살펴보니 또 하나의 벽 위로 ‘출입엄금 – 이곳은 나의 사유지이므로 방해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의 글이 빨간색 손글씨로 적혀 있어서, 역시 뭔가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주인이 김밥이 든 봉지를 들고 그 창구로 나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주인이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절하면 어느 수위까지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며 기다렸다. 마침내 누군가가 나왔는데 보니까 알바 여직원이었다.
그녀에게 김밥이 적게 배달되었는데 환불도 안 되었다고 말했으나, 들은 척도 안하고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우리가 사장을 다시 불러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이번에는 사장 아주머니가 나왔다(나는 투박한 남자가 주인일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였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너무나 선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연방 고개를 숙이면서 눈썹이 여덟 팔자가 되었다. 매일 문자 200-300개를 받다 보니 다 확인을 못해서 그랬다면서 울상을 짓더니 곧바로 배민을 통해 환불을 해주었다. 이어서 ‘김밥계의 에르메스’ 김밥 3개를 우리 손에 쥐어 주었다.
우리는 돌아오면서 말했다. “우리보다 훨씬 착한 분 같은데?” 곧이어 우리들 사이에 서로 자기가 제일 나빴다며 반성 경쟁이 시작되었다. 댓글만 보았을 때는 김밥집 사장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다.
진실을 알기 위해 남의 글만 보지 말고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꼈다. 우리의 수사나 재판도 너무 기록상의 글 중심이다. 그 사람의 눈빛, 음색, 말투, 말의 속도와 더듬는 정도, 걸음과 서 있는 자세, 전체적인 인상과 분위기 같은 것은 현실에서 사람을, 진실을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데도 기록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판사들이 판결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글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나도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해보니 판사일 때 기록상의 글의 논리와 일관성에 너무 과한 비중을 두었던 것 같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두 번 이상만 유사하게 반복되면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신빙성을 부여해서 억울한 피고인을 양산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왜 했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자기도 모르게 하지 않으려 했던 말이 입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의 뜻과 다른 내용이 발설되기도 한다. 지엽적인 말 한두 마디에 현혹 당하면 사건의 핵심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판사일 때는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유니폼을 입고 경직된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이나 증인이 양복을 입고 경직된 자세로 앉아서 하는 말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극 배우의 대본처럼 준비된 것인지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어서 당사자를 법정 외에도 이런저런 장소에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편하게 만나서 판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소통하다 보니 사건의 진상도, 당사자의 인격도, 그가 하는 말의 진정성도 훨씬 입체적으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그래도 끝내 모르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판사 때를 기억해보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강했던 것 같다. 변호사가 비록 사건의 진상을 잘 알 수 있다고 한들 판사 입장에서는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만큼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고 경계하는 것이다.
요컨대, 판사는 기록에 갇혀서 그 너머를 보기 어렵고, 변호사는 진상을 알아도 판사의 불신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휩쓸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실의 과녁을 명중하지 못하는 재판이 넘쳐나는가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