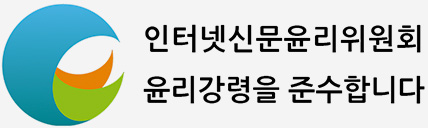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 공탁’은 그동안 사법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적 꼼수’로 지적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으려다가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법원과 구치소를 직접 발로 뛰며 접견과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숙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늦게 공탁하는 것은 그런 뻔뻔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탁이 선고 직전까지 밀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속 합의를 시도하다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선고가 임박해야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는 경우다. ‘기습’, ‘꼼수’ 등 언론에 회자 되는 수식어는 이런 뒷배경까지는 담지 못하는 것 같다.
공탁 제도 자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 역시 온당치 않다. “민사 배상을 통해 범죄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으니, 형사 공탁 제도가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일단 형사 공탁은 민사 상 배상에 비해 빠르고 효율적이다.
피해자가 민사 배상을 받으려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판결 확정까지 오랜 시일을 기다려야 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도 지출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도 피해자에게 실익이 더 크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피고(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개인의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승소 금액이 1억 원이라 해도 실제로 원고(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감형이 걸린 형사 재판에서는 공탁금을 마련할 때, 당사자는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 소송으로는 받을 수 없는 돈인데 형사 공탁 제도가 있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탁 자체를 문제 삼고 그 통로를 막았을 때 예상되는 역효과는 분명하다. 감형이 절박한 피고인, 특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면 당장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피해자에게 주는 선택 대신 ‘재판부와 아는 사이다’는 등의 허황된 말로 피고인을 유혹하는 변호사에게 지출하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돈도 못 받고 변호사만 반사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공탁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굴레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돈이든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정의에 부합한다. 응보와 예방뿐 아니라 피해회복 역시 법이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선고 직전 공탁을 ‘꼼수’로 몰아붙이기 전에 그 돈의 쓰임새가 옳은지, 그른지부터 냉정히 따져야 한다. 공탁은 형량 흥정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사죄이자 위로가 될 수 있다.